티스토리 뷰
오랜만에 숨 안 쉬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달리듯이 읽은 책 만났다. <コンビニ人間> 몇년 전에 <아쿠타가와 상> 수상했대서 화제였던 책이라 제목을 기억하고 있었다. 읽을 사람들은 이제 다 읽었는지 도서관에 꽂혀있는 걸 발견. 도서관 책 예약하면 순서대로 연락해주는데 예약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읽으라고 메일 받는 순간 괜히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리스트 짜서 읽을 책을 미리 정한 건 꼭 누가 공부시키는 것 같아 거북해진다. 아.. 이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구나..(깨달음) 마치 자유로운 영혼인척 그날의 기분이랑 타이밍이 맞아 어쩌다 손에 들린 책을 읽는 일이 많다. 그리고 빌린 책이 아니라 구입한 책이라도 본전 생각하지 않고 내 스타일이 아닌 거 같으면 도중에 하차한다. 책은 꾸역꾸역 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독서 자체를 그만 둔 것도 아니고 시간과 감정을 내주면서 붙잡고 있는게 더 손해인 거 같더라. 그래서 완독한 책은 별로 없다. 그래도 이런 습관때문에 책 읽는게 힘들지 않게 됬다. 요즘엔 리디북스와 중고책 사이트, 도서관이 있으니까 책 갈아타는 게 사치도 아닌 것.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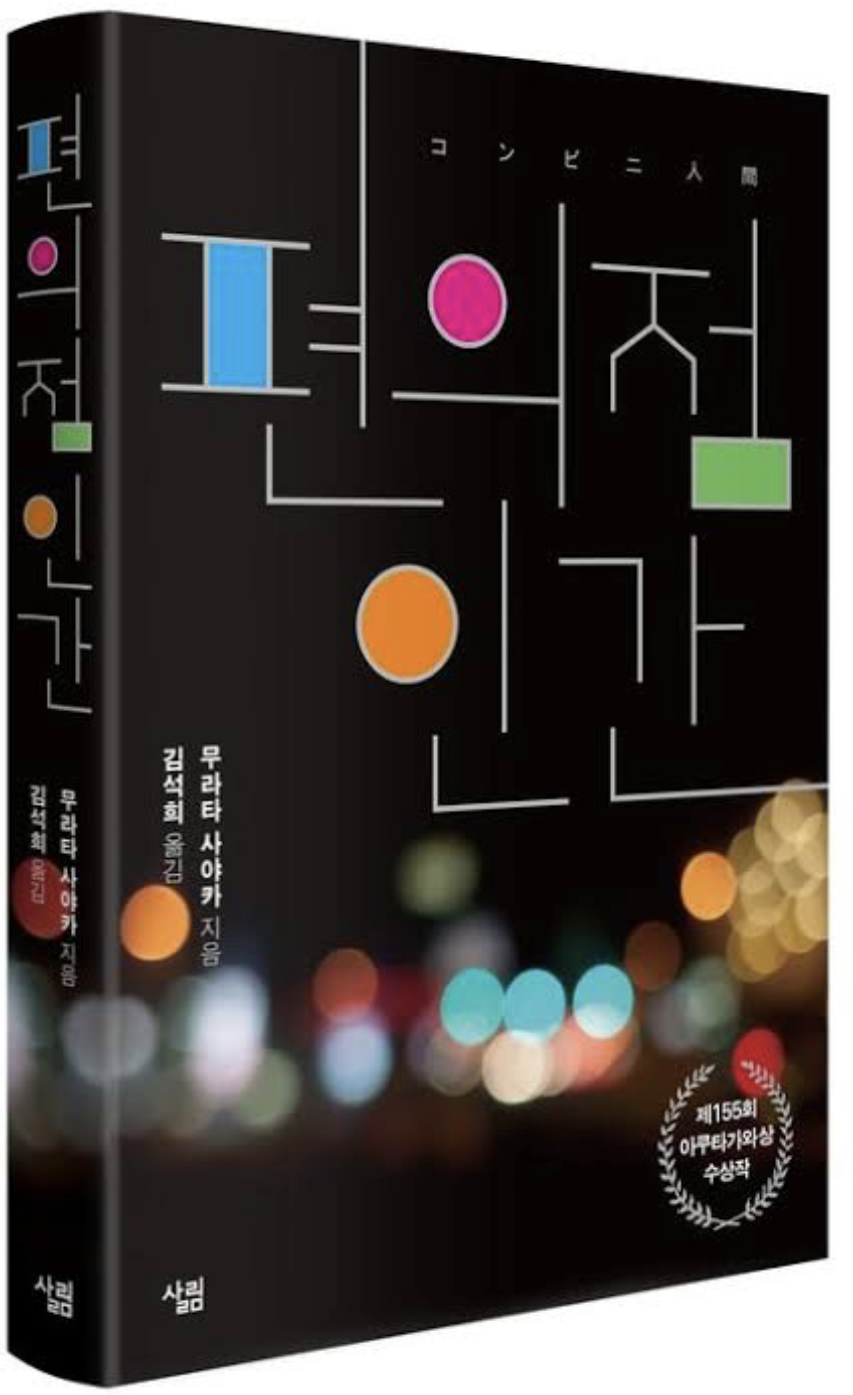
한국어 번역본은 <편의점 인간>
이 책의 더 어울리는 표지는 일본판인 거 같다. 저 기괴하고 끈적한 느낌이 아주 핵심이다. 한국 표지의 네온사인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도시를 빗댄 내용이 아니다. (아 스포하고 싶다.) 참고 몇가지의 감정만 전달하자면 나는 미친듯이 웃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달려갈 때의 그 기분은 사이다도 이런 사이다가 없었다. 다 뒤집어 엎은 사이다가 아니라 조용히 은밀히 개사이다였다. 주인공은 세간에 절대 이해받을 수 없는 특이한 사람이지만 그 특별한 시야때문에 지극히 범인 (凡人)이자 하수인 일개 나는 여러모로 큰 가르침을 받았다. 선입견 편견에 조용히 빅엿을 먹일 색다른 스킬. 그리고 나 또한 쩔디 쩔은 속물 덩어리라 '편의점 인간' 같은 그들에게 어떤 점을 닥치고 있어야하는지 배웠다. 후.. 더 많이 떠들고 싶군.
미국에선 어떤 표지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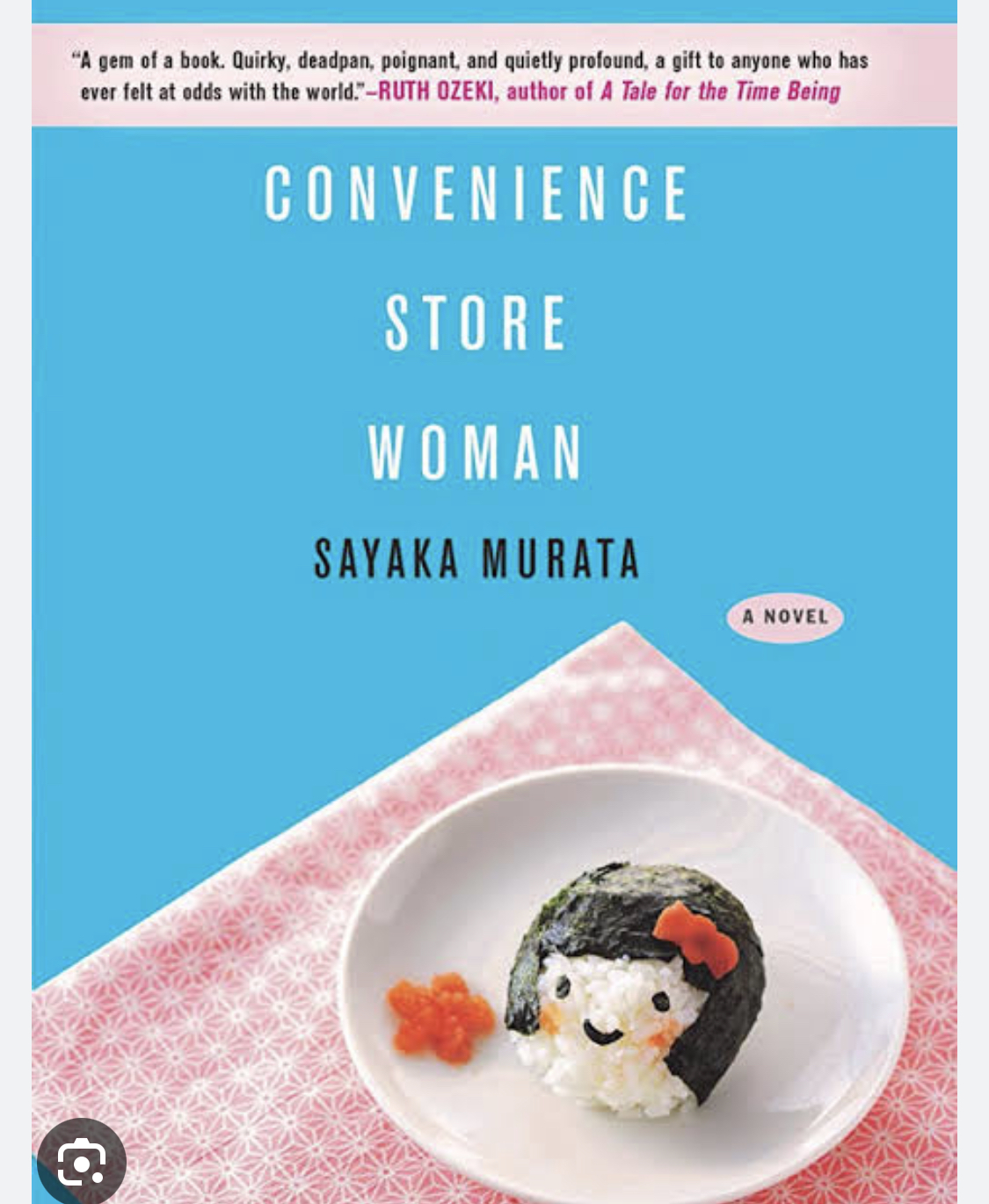
므믘 깜찍해... 일본 편의점에 저런 귀여운 오니기리가 판다고 오해하는 거 아냐?

버전이 많네?

컬러도 고를 수 있네? 근데 파스텔 톤으로... 중간에 많이 실망할텐데...한국이나 일본에서 잡지 표지 두어개 나오는 건 본 적있는데 소설 표지의 디자인을 고를 수 있는 건 아무튼 좋은 거 같다. 결론, 3국의 표지 중에 일본 표지가 제일 알맞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넷플로 하루랑 같이 본 영화가 너무 좋았다. 초난강이 나와서 사실 보고 싶지 않았... (쿠사나기 츠요시상 스미마셍) 스마프 그룹도 좋아하고 예능에 나오는 쿠사나기는 너무 좋은데 나는 이 분의 연기가 왠지 오그라든다. 연기 실력이 어떻고가 아니라 그 배우와 나의 합? (뭐래 나 감독이냐고)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다. 리카짱은 쿠사나기 츠요시 출연작을 다 좋아해서 일부러 모든 영화를 찾아볼 정도라고. 이 영화도 처음 10분 보고 사실 껐... 그러다가 아이들 나오는 장면까지만 보자 참았더니 초반과 마지막 회상 장면 빼고 쿠사나기 츠요시의 씬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펼쳐지는 작은 모험이야기가 너무 대박 사랑스럽고 좋았던 것. 압권은 애들 연기가 또 얼마나 일품이던지요. 그리고 1986년을 완벽 재현한 여러 소품과 요소들이 분명 난 본 적이 없을텐데 한국에서의 내 어린 시절과도 겹쳐서 내내 즐거웠다. 아마 감성적으로 겹쳐졌던 거 같다. (주인공 엄마가 애들 머리통을 치며 잔소리 하는 모습이라던가 ㅎㅎ)

일본어 제목은 <サバカン> 고등어 통조림이란 뜻이다.

일본은 약간 옴니버스 스타일일 거 같은 디자인이라서 의외였다. 영화를 다 본 사람으로서 제 느낌은요.

한국 포스터가 찰떡이다!!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다 이거 저 다 찌그러진 핑크 자전거에 절규하는 주인공. 둘의 모험이 시작된다!!!

담벼락에 저 돌고래 그림. 이런데 그려져있었나? 되게 의미있는 그림인데 저거. 본 지 얼마 안된 영화인데도 추억돋게 만드는 포스터다. 잘했다 잘했어.

한국 포스터가 다 너무 찰떡이다. 이렇게 아련하고 귀엽고 그렇다. 영화를 다 본 하루의 감상은 이랬다.
"친구는...좋다 엄마..."
참 한가지 스포하자면 중간에 한국어를 읽을 줄 아는 여고생이 나오는데 '한국에 가 봤어?' 하니까 '아니' 가아니라 '아직...'이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근데 그 이후로 떡밥이 안 풀려서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별로 큰 의미의 에피소드는 아님) 재일교포라는 설정이 유력했다.소설에는 좀 더 나오는 모양이다. (원작이 소설이라고) 하루랑 같이 보다가 한국에 관한 장면이 나와서 어!!!! 했다. ㅎㅎ

그리고 여름 휴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감상한 대박 영화. <In The Heights> 원래 그 옆의 로맨스 영화 보려던 건데 잘못 눌렀다. 잘못 누른 내 손가락에게 합격 목걸이 그려줄거야. 뮤지컬 영화였는데 라라랜드 10배로 재밌었다. 나의 숨겨져있던 개취를 발견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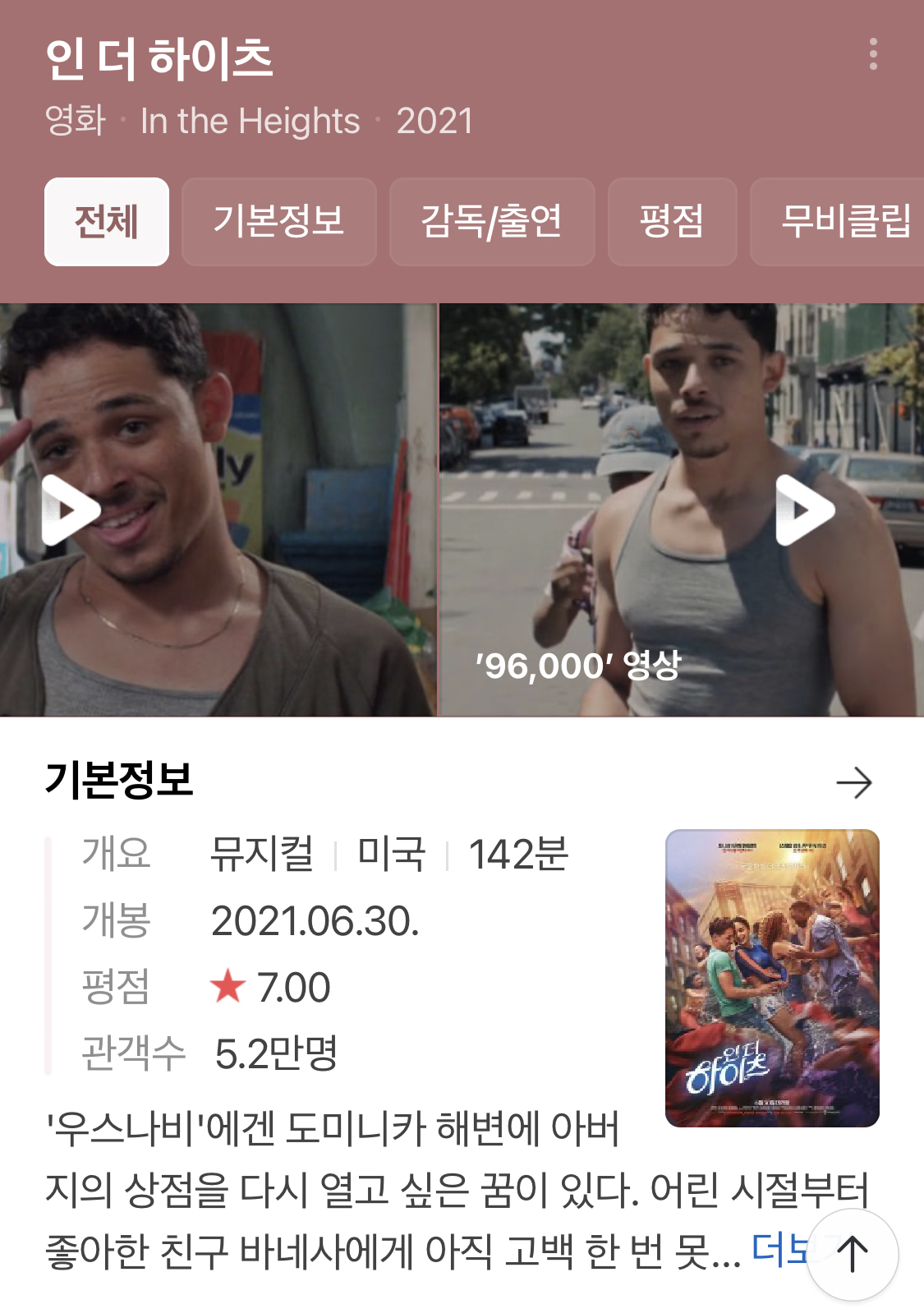
도미니카 공화국 이민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아는바가 없는 나라여서 더더욱 신선했다. 내가 중남미의 흥을 좋아하네.. 이건 누가 봐도 좋은거겠지? 남미 미인의 잡아끌어당기는 듯한 이목구비에 홀려서 화면정지 시키고 샅샅히 훑기도 했다. 노래를 잘하는 건 입만 아프고 목소리 톤이랑 울림이. 악!!! 눈도 귀도 너무 극락.
한가지 자꾸 잡생각이 들던 모멘트는 <브룩클린 99> 미드에서 냉혈하고 시크하고 터프한 <로사 디아즈>가 미용실 직원으로 똥꼬발랄하게 나와서 적응이 안됐다. ㅎㅎ
'대화 하는 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왼쪽 오른쪽 (9) | 2023.11.21 |
|---|---|
| 사장 욕하면서 다니던 사무직을 때려친 (6) | 2023.11.14 |
| 누군가 지난 일들에 대해 곱씹는다면 (10) | 2023.08.12 |
| 마흔넘어 영어 : 알렉산더의 한국 기억 (23) | 2023.08.04 |
| 결혼과 적성 그리고 색맹 (24) | 2023.08.02 |

